
Descri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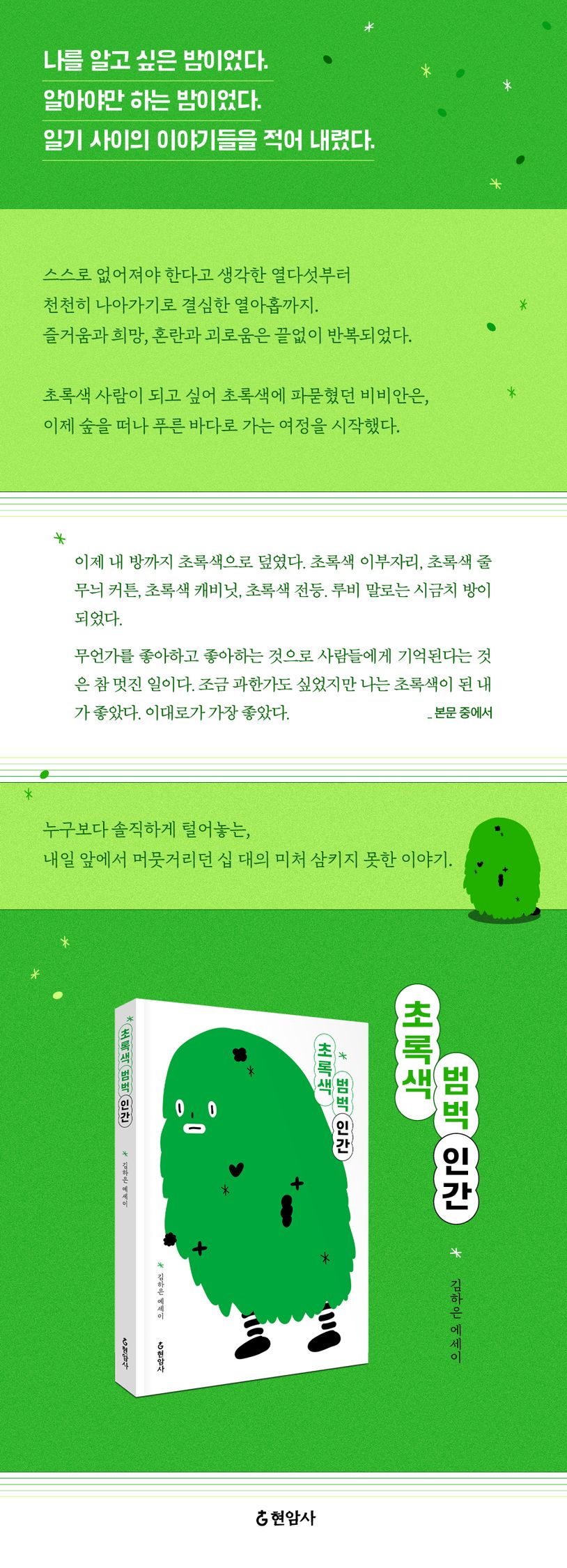
나를 알고 싶은 밤이었다. 알아야만 하는 밤이었다.
일기 사이의 이야기들을 적어 내렸다.
일기 사이의 이야기들을 적어 내렸다.
서점에서 청소년이 직접 쓴 청소년의 이야기를 찾기는 어렵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책들은 대부분 그 시기를 멀리서 기억하고 있는 어른들이 쓴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또래의 이야기를 마주하고 싶었던 김하은 작가는 해일 같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하기로 했다.
그 무엇도 정해져 있지 않아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린다. 불안과 공포, 희망과 기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은 쉽게 다스려지지 않는다. 학교와 학원, 집과 기숙사를 오가던 시절, 아직 많은 경험이 처음인 때라면 더욱 혼란에 빠지기 쉽다. 이 해일 같은 시기는 자주 사춘기라는 단어 하나로 축약되고는 하지만 겪어본 사람도 겪고 있는 사람도 그 세 음절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과 고통이 담겨 있는지 알 것이다.
비비안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열아홉, 그 힘들다는 고3일 때였다. 열다섯에 친구를 잃고 나서 생긴 우울은 좀체 떨어지지 않고 스물을 목전에 둔 이때까지 비비안을 혼란의 늪에 빠뜨렸다. 하지만 비비안은 그런 와중에도 고등학교에서 새 친구들을 만나고, 서점에서 처음 보는 시집을 골라내 읽고,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하루를 이어간다. 초록색의 싱그러움을 동경해 주위를 모두 초록색으로 채우고 그 안에 파묻히려 했던 비비안은, 자신의 안락한 산에서 벗어나 푸르고 차가운 심해를 향해 떠나기로 했다.
“나는 초록색이 된 내가 좋았다. 이대로가 가장 좋았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에 코로나가 터졌다. 입학은 한없이 밀렸고 일상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지겨운 학교생활은 덜하게 된 건 기꺼운 일이지만,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진 건 즐겁지 않았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비비안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남들처럼 학교와 학원, 기숙사와 집을 오가고 있었지만 대학에 갈 수는 있을지 고민이 가득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간 정신과를 계속 다니고 있었지만, 의사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자신에게는 병명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병명을 추측만 하는 채로 약을 먹으며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쉽지 않은 하루하루 사이에도 즐거운 일은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 떠들고 노는 모든 순간이 우연의 형태를 띤 영화 같았다. 화상 수업 기간에 친구들과 함께 모여 수업을 듣다가 장난을 치며 웃고, 생일이면 멀리 있는 서로의 집까지 가서 케이크의 촛불을 껐다. 때때로 서점에 가서 문구 코너를 뒤지며 속으로 노래를 불렀고, 표지에 이끌려 시집을 샀다가 시의 세계에 빠져버리기도 했다. 그대로 좋아하는 초록색을 온 몸에 두르고 그 속에 파묻혀버리고 싶었다.
또래의 이야기를 마주하고 싶었다
시에 빠져 다른 사람들의 문장을 읽던 김하은 작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다. 정해진 나이에 정해진 것을 해야 하는 사회 속에서 별 수 없이 별나진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다. 휴대폰 메모장에 써놓은 단상과 일기들을 뒤적여가며,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과 자신의 감정을 정제하지 않고 토해내듯이 써내려갔다.
그간 혼자서만 품었던 행복과 아픔은 고스란히 문장이 되고 시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리게 되었다. 그는 비비안의 이야기가 남들처럼 지내지 못하는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문장 속에 생생히 살아 있는 날것의 감정을 읽다 보면 누구든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을 자신의 생채기를 다시 떠올리게 될 것이다. 비슷한 감정을 품고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는 그 아픈 문장들에 공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내 바다에 닿았다.”
이제 그는 스무 살, 아직도 어리지만 조금 더 넓은 세상을 살아가야 할 나이가 되었다. 스물이 되어 열아홉의 말들을 책의 형태로 다듬기 시작했을 때 그는 차마 원고를 많이 고칠 수 없었다. 설령 훗날 미숙하고 치기 어려 보인다고 생각하게 될지라도 그걸 겪고 있는 당시의 자신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출간될 원고를 퇴고하면서 나한테서 나오는 문장들에 익숙해졌다. 살기 위해 포장 없이 뱉어내었던 글들을 많이 고칠 순 없었다. 산문 쓰는 법을 얼추 배운 지금, 그 글들을 고치면 날것의 느낌이 모조리 사라질 것만 같았다. 어느 날은 부끄러움에 몸서리쳤고 어느 날은 참을 수 없어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바를 멍하니 누르면서 활자들이 사라지는 모양을 가만 지켜보았다.
슬프다. 울었다. 나는 일기에 저 말들을 자주 썼다. 지금 나를 지배하는 감정이 사라지기 전에 형용해서 써내야 한다는 생각에 단정 지어버린 감정들이었다. 이상하게 저 단어들을 마주하는 나는 전혀 슬프지 않았다.”_본문 중에서
스물이 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저 그냥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할 뿐이다. 세상의 모든 비비안들이 산에서 벗어나 푸른 바다로 향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무엇도 정해져 있지 않아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린다. 불안과 공포, 희망과 기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은 쉽게 다스려지지 않는다. 학교와 학원, 집과 기숙사를 오가던 시절, 아직 많은 경험이 처음인 때라면 더욱 혼란에 빠지기 쉽다. 이 해일 같은 시기는 자주 사춘기라는 단어 하나로 축약되고는 하지만 겪어본 사람도 겪고 있는 사람도 그 세 음절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과 고통이 담겨 있는지 알 것이다.
비비안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열아홉, 그 힘들다는 고3일 때였다. 열다섯에 친구를 잃고 나서 생긴 우울은 좀체 떨어지지 않고 스물을 목전에 둔 이때까지 비비안을 혼란의 늪에 빠뜨렸다. 하지만 비비안은 그런 와중에도 고등학교에서 새 친구들을 만나고, 서점에서 처음 보는 시집을 골라내 읽고,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하루를 이어간다. 초록색의 싱그러움을 동경해 주위를 모두 초록색으로 채우고 그 안에 파묻히려 했던 비비안은, 자신의 안락한 산에서 벗어나 푸르고 차가운 심해를 향해 떠나기로 했다.
“나는 초록색이 된 내가 좋았다. 이대로가 가장 좋았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에 코로나가 터졌다. 입학은 한없이 밀렸고 일상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지겨운 학교생활은 덜하게 된 건 기꺼운 일이지만,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진 건 즐겁지 않았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비비안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남들처럼 학교와 학원, 기숙사와 집을 오가고 있었지만 대학에 갈 수는 있을지 고민이 가득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간 정신과를 계속 다니고 있었지만, 의사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자신에게는 병명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병명을 추측만 하는 채로 약을 먹으며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쉽지 않은 하루하루 사이에도 즐거운 일은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 떠들고 노는 모든 순간이 우연의 형태를 띤 영화 같았다. 화상 수업 기간에 친구들과 함께 모여 수업을 듣다가 장난을 치며 웃고, 생일이면 멀리 있는 서로의 집까지 가서 케이크의 촛불을 껐다. 때때로 서점에 가서 문구 코너를 뒤지며 속으로 노래를 불렀고, 표지에 이끌려 시집을 샀다가 시의 세계에 빠져버리기도 했다. 그대로 좋아하는 초록색을 온 몸에 두르고 그 속에 파묻혀버리고 싶었다.
또래의 이야기를 마주하고 싶었다
시에 빠져 다른 사람들의 문장을 읽던 김하은 작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다. 정해진 나이에 정해진 것을 해야 하는 사회 속에서 별 수 없이 별나진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다. 휴대폰 메모장에 써놓은 단상과 일기들을 뒤적여가며,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과 자신의 감정을 정제하지 않고 토해내듯이 써내려갔다.
그간 혼자서만 품었던 행복과 아픔은 고스란히 문장이 되고 시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리게 되었다. 그는 비비안의 이야기가 남들처럼 지내지 못하는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문장 속에 생생히 살아 있는 날것의 감정을 읽다 보면 누구든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을 자신의 생채기를 다시 떠올리게 될 것이다. 비슷한 감정을 품고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는 그 아픈 문장들에 공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내 바다에 닿았다.”
이제 그는 스무 살, 아직도 어리지만 조금 더 넓은 세상을 살아가야 할 나이가 되었다. 스물이 되어 열아홉의 말들을 책의 형태로 다듬기 시작했을 때 그는 차마 원고를 많이 고칠 수 없었다. 설령 훗날 미숙하고 치기 어려 보인다고 생각하게 될지라도 그걸 겪고 있는 당시의 자신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출간될 원고를 퇴고하면서 나한테서 나오는 문장들에 익숙해졌다. 살기 위해 포장 없이 뱉어내었던 글들을 많이 고칠 순 없었다. 산문 쓰는 법을 얼추 배운 지금, 그 글들을 고치면 날것의 느낌이 모조리 사라질 것만 같았다. 어느 날은 부끄러움에 몸서리쳤고 어느 날은 참을 수 없어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바를 멍하니 누르면서 활자들이 사라지는 모양을 가만 지켜보았다.
슬프다. 울었다. 나는 일기에 저 말들을 자주 썼다. 지금 나를 지배하는 감정이 사라지기 전에 형용해서 써내야 한다는 생각에 단정 지어버린 감정들이었다. 이상하게 저 단어들을 마주하는 나는 전혀 슬프지 않았다.”_본문 중에서
스물이 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저 그냥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할 뿐이다. 세상의 모든 비비안들이 산에서 벗어나 푸른 바다로 향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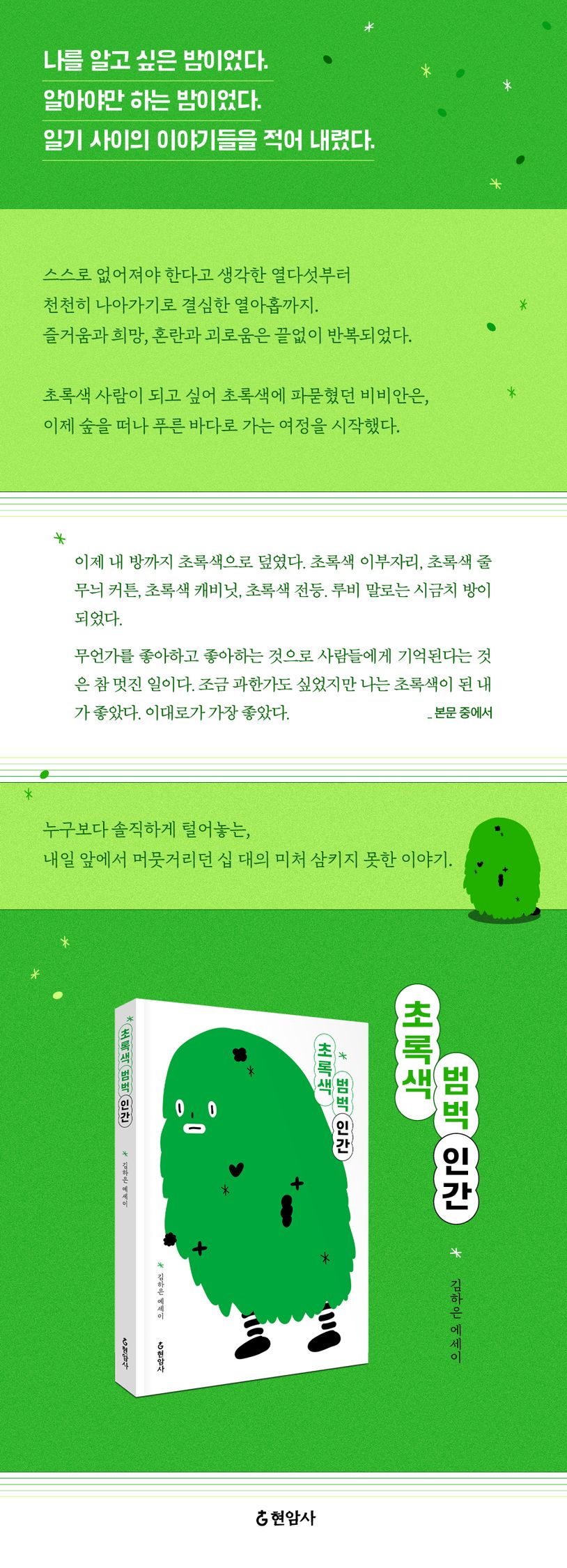

초록색 범벅 인간 (김하은 에세이)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