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scri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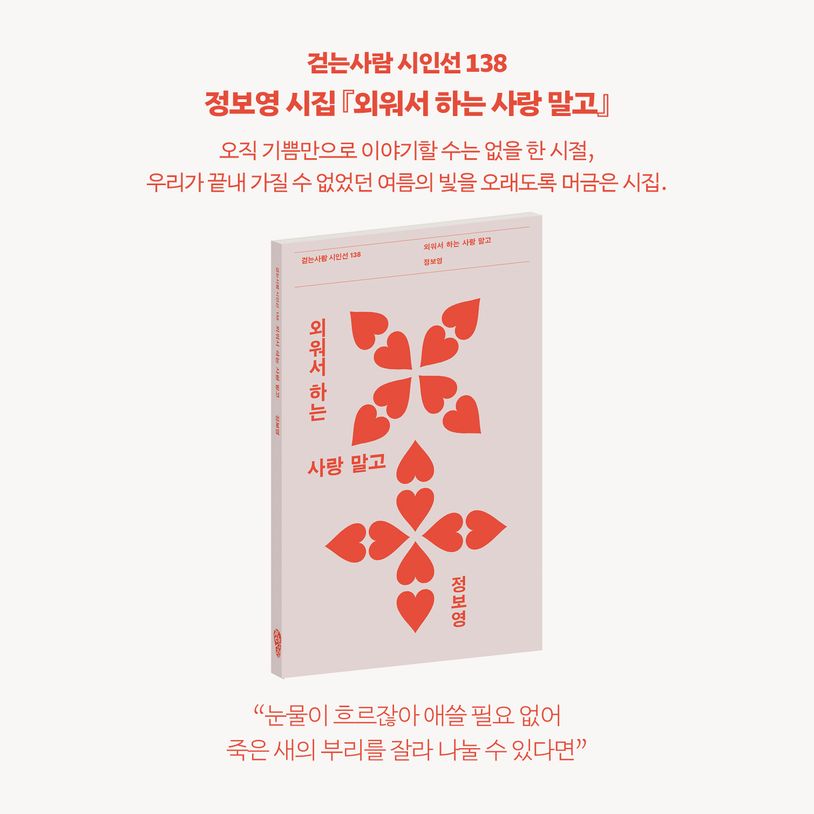
걷는사람 시인선 138
정보영 시집 『외워서 하는 사랑 말고』 출간
“눈물이 흐르잖아 애쓸 필요 없어
죽은 새의 부리를 잘라 나눌 수 있다면”
오직 기쁨만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한 시절,
우리가 끝내 가질 수 없었던 여름의 빛을 오래도록 머금은 시집
정보영 시집 『외워서 하는 사랑 말고』 출간
“눈물이 흐르잖아 애쓸 필요 없어
죽은 새의 부리를 잘라 나눌 수 있다면”
오직 기쁨만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한 시절,
우리가 끝내 가질 수 없었던 여름의 빛을 오래도록 머금은 시집
정보영 시인의 첫 번째 시집 『외워서 하는 사랑 말고』가 걷는사람 시인선 138번째 작품으로 출간되었다. 에세이 『서른이면 뭐라도 될 줄 알았지』, 앤솔러지 시집 『지구 밖의 사랑』을 통해 꾸준히 독자를 만나 온 시인 정보영이 가진 시 세계의 정경이 마침내 하나의 책으로 묶였다.
정보영은 청춘의 환희와 불안, 사랑과 상실의 감각을 통과해 온 이들만이 감지할 수 있는 감정의 결을 세밀하게 포착한다. “넘칠 듯 빛나”(「그립」)는 여름의 눈부심을 노래하면서도 그 빛이 동반하는 그늘을 외면하는 법이 없기에, 우리는 시인이 포착한 “눈 감으면 선명한 여름”(「화곡」)을 들여다보며 묘하게 익숙한 떨림을 마주하게 된다. 가령 “어둑어둑한 낮”(「깜짝 지난여름」)이나 “버려진 화분뿐인 골목”, 다만 “한입 베어 물기에 딱 알맞”은 “말캉한 자두”(「썸머타임」) 등 시집 곳곳에 배어 있는 무덥고도 서늘한 풍경이 한 시절을 고스란히 담아낸 서정의 기록이 되어 읽는 이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다. 독자로 하여금 제 몫이 아닌 장면까지도 생생히 불러일으키는 감각의 세계는 자신도 모르게 지나쳐 간 언젠가의 여름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는다.
또한 시인은 “모든 슬픔과 고통 속에서” 서로를 지탱했던 미숙하지만 따뜻한 연대, 사랑의 열락과 이별 이후의 공허까지도 함부로 미화하거나 은폐하지 않는다. 다만 “그 여름을 향해/손을 뻗”(「그립」)는 방식으로 ‘우리’의 가능성을 또렷하게 펼쳐 낼 뿐이다. 그러니 여름이라는 불확실한 세계에서만큼은 “우리는 소나무와 천사라는 말이 좋아서 소나무가 되었다가 천사가 되었다가 눈부신 풍경을 나눠”(「소나무와 천사」) 가지는 불가한 일이 가능해진다.
여름은 “분명한 환희 속에 불분명한 불안이 잔뜩 도사리고 있던 시절”이므로 “우리에게 젊음이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앓는 것”(임지훈, 해설)에 다름없다. 다만 기대보다 불안이 앞서 좋은 날보다 어려운 날이 많았던 계절이었음에도, 가만히 서로의 손을 쥔 채로 한 시절을 견뎌낸 우리의 젊음이 그 여름을 통과해 왔다는 진실은 명료하다. 한때의 호우가 결국은 지나가듯, 기쁨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상실마저도 우리의 일부였음을. 시인은 그 모든 시간을 건너 지금 이곳에 도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충분한 기적임을 일러 주며, 또 다른 시절로 나아갈 ‘우리’라는 이름의 가능성을 다시금 짚어 낸다.
누구보다 섬세한 언어로 젊음의 상흔과 희망, 고독과 사랑을 직조하는 정보영 시인의 첫 시집이 기다림 끝에 세상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 조대한 문학평론가의 말처럼 “어디로 조문을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지난날과 “밤마다 몰래 눈물을 흘린”(「세상의 모든 안녕」) 슬픔의 시간들이 그 누구보다 열렬히 시를 사랑했던 한 청년의 세월과 겹쳐 유달리 아름답고 서정적인 무늬를 그려” 내는 이 시집을 펼친다면, 우리 모두가 지나온 하나의 계절을, 오직 기쁨만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찬란하고도 씁쓸한 시절을 비추는 사려 깊은 시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형광등 스위치를 켜 봅니다.
깜빡한 게 있다는 듯
가득한 빛
빛을 쥐었다 폅니다.
아무도 사라지지 못하게
-「깜짝 지난여름」 부분
정보영은 청춘의 환희와 불안, 사랑과 상실의 감각을 통과해 온 이들만이 감지할 수 있는 감정의 결을 세밀하게 포착한다. “넘칠 듯 빛나”(「그립」)는 여름의 눈부심을 노래하면서도 그 빛이 동반하는 그늘을 외면하는 법이 없기에, 우리는 시인이 포착한 “눈 감으면 선명한 여름”(「화곡」)을 들여다보며 묘하게 익숙한 떨림을 마주하게 된다. 가령 “어둑어둑한 낮”(「깜짝 지난여름」)이나 “버려진 화분뿐인 골목”, 다만 “한입 베어 물기에 딱 알맞”은 “말캉한 자두”(「썸머타임」) 등 시집 곳곳에 배어 있는 무덥고도 서늘한 풍경이 한 시절을 고스란히 담아낸 서정의 기록이 되어 읽는 이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다. 독자로 하여금 제 몫이 아닌 장면까지도 생생히 불러일으키는 감각의 세계는 자신도 모르게 지나쳐 간 언젠가의 여름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는다.
또한 시인은 “모든 슬픔과 고통 속에서” 서로를 지탱했던 미숙하지만 따뜻한 연대, 사랑의 열락과 이별 이후의 공허까지도 함부로 미화하거나 은폐하지 않는다. 다만 “그 여름을 향해/손을 뻗”(「그립」)는 방식으로 ‘우리’의 가능성을 또렷하게 펼쳐 낼 뿐이다. 그러니 여름이라는 불확실한 세계에서만큼은 “우리는 소나무와 천사라는 말이 좋아서 소나무가 되었다가 천사가 되었다가 눈부신 풍경을 나눠”(「소나무와 천사」) 가지는 불가한 일이 가능해진다.
여름은 “분명한 환희 속에 불분명한 불안이 잔뜩 도사리고 있던 시절”이므로 “우리에게 젊음이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앓는 것”(임지훈, 해설)에 다름없다. 다만 기대보다 불안이 앞서 좋은 날보다 어려운 날이 많았던 계절이었음에도, 가만히 서로의 손을 쥔 채로 한 시절을 견뎌낸 우리의 젊음이 그 여름을 통과해 왔다는 진실은 명료하다. 한때의 호우가 결국은 지나가듯, 기쁨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상실마저도 우리의 일부였음을. 시인은 그 모든 시간을 건너 지금 이곳에 도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충분한 기적임을 일러 주며, 또 다른 시절로 나아갈 ‘우리’라는 이름의 가능성을 다시금 짚어 낸다.
누구보다 섬세한 언어로 젊음의 상흔과 희망, 고독과 사랑을 직조하는 정보영 시인의 첫 시집이 기다림 끝에 세상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 조대한 문학평론가의 말처럼 “어디로 조문을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지난날과 “밤마다 몰래 눈물을 흘린”(「세상의 모든 안녕」) 슬픔의 시간들이 그 누구보다 열렬히 시를 사랑했던 한 청년의 세월과 겹쳐 유달리 아름답고 서정적인 무늬를 그려” 내는 이 시집을 펼친다면, 우리 모두가 지나온 하나의 계절을, 오직 기쁨만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찬란하고도 씁쓸한 시절을 비추는 사려 깊은 시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형광등 스위치를 켜 봅니다.
깜빡한 게 있다는 듯
가득한 빛
빛을 쥐었다 폅니다.
아무도 사라지지 못하게
-「깜짝 지난여름」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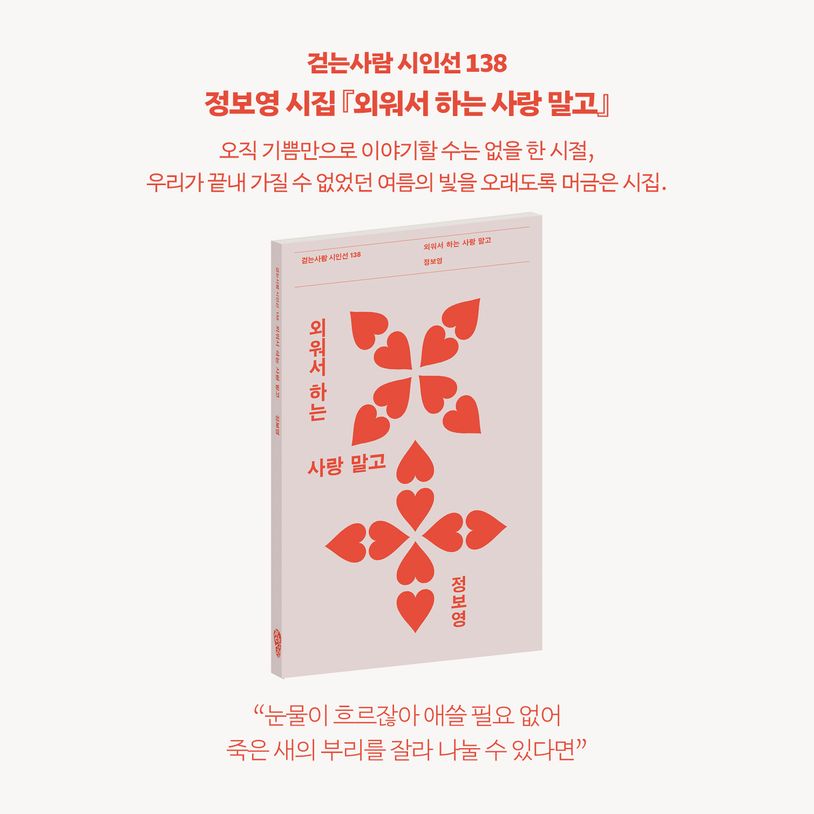

외워서 하는 사랑 말고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