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scri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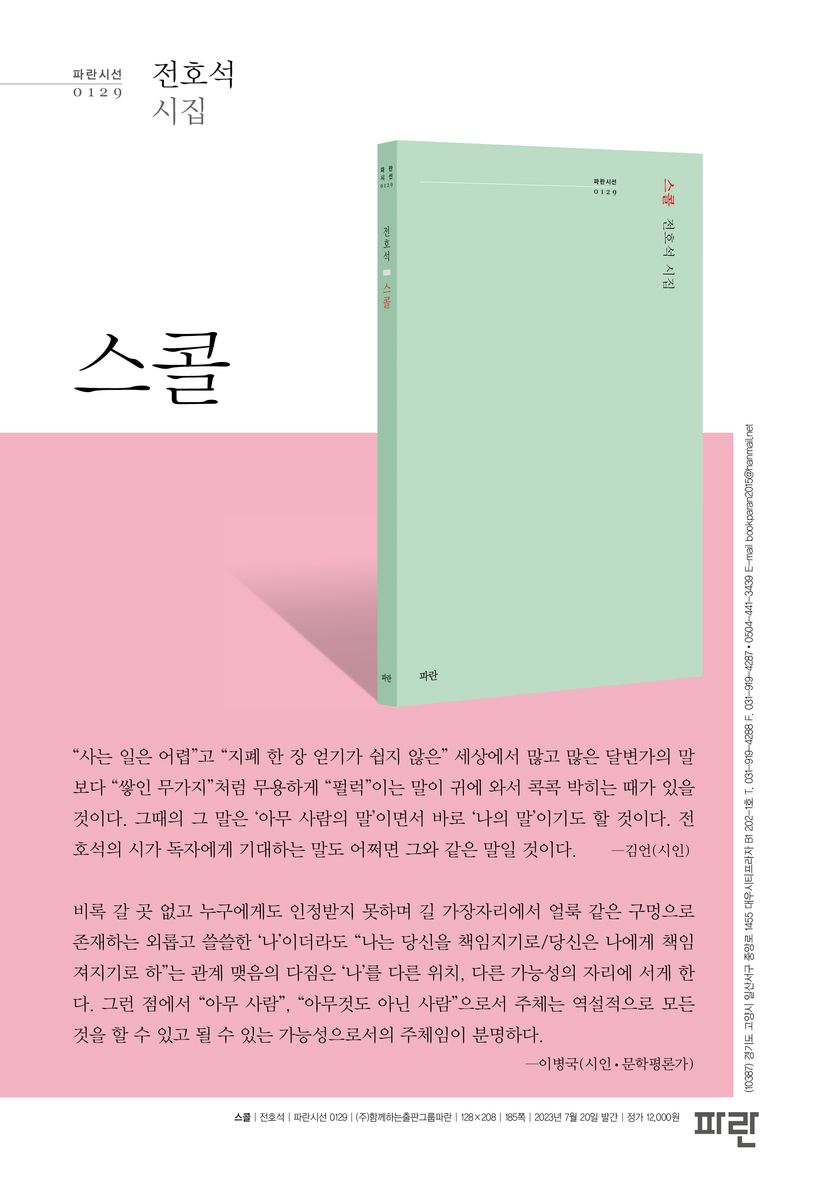
알 수 없는 말을 한다면 알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스콜]은 전호석 시인의 첫 번째 신작 시집으로, 「학림」, 「반투명」, 「행신」 등 65편의 시가 실려 있다.
전호석 시인은 1989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2019년 [현대시]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시집 [스콜]을 썼다.
“전호석 시인이 표상하는 주체는 “불붙은 도화선처럼 해롱거렸고 끄트머리에 무엇이 달려 있을지도” 모르는 채 “부글부글” 끓고 있다(「수류탄」). 언제 터질지 모를 내면의 “균열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어”지더라도(「앞선 일행」) 그것이 환멸을 예비하는 데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전호석 시인은 끓는점에 도달한 주체에게 “참을 수 없어지면” “침묵 비슷한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선성(善性)」). 천성이 선한 시인은 세계를 향해 수류탄을 던지기보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택한다. “정면으로 마주치지 말 것/터진 마음을 추스를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아무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돌보고자 한다(「방울」). 이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한 것처럼 생명 없는 백색 표면들, 빛나는 검은 구멍들, 공허와 권태를 지닌 거대한 판으로서의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실패를 무릅쓰고 세계가 요구하는 것에 저항하는, 잉여적 존재의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라 말해도 좋을 것이다.
“아무 사람”은 그 무엇도 아닌 사람이자 잉여적 존재이지만, 세계의 균열을 체현하며 틈새를 확장하는 부정태로서의 주체를 긍정하는 기제이다. 전호석 시인의 “아무 사람”이 왜소화된 주체의 비애나 환멸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흐르는 것들은 흐르고 내리는 것들은 내”린다. 그것은 현상일 따름이다. 현상을 응시하는 본질로서의 “나는 있다”. ‘나’는 침범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다. “몸에 가득한 실금”이 “나를 괴롭히는 일”은 “이해의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불안을 야기할지언정 주체를 붕괴시키지는 못한다. 오히려 이러한 부정적 현상은 주체를 단단하게 하고 “온몸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다음 장면을 위”한 토대가 된다. 그럼으로써 전호석 시인의 ‘나’는 무엇에든 고착되지 않는 “아무 사람”이 되어 매 순간 유동하는 주체로 무한히 확장할 가능성을 획득하는 것이다.(「lecture」)
또한 확장 가능성은 주체의 내면에 한정되기보다는 타자를 향한 구체적 행위를 타진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모바일」) “다음 장면”을 생성하는 수행이야말로 전호석 시인이 희구하는 주체의 양태일 것이다. 비록 갈 곳 없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며 길 가장자리에서 얼룩 같은 구멍으로 존재하는 외롭고 쓸쓸한 ‘나’이더라도 “나는 당신을 책임지기로/당신은 나에게 책임져지기로 하”는 관계 맺음의 다짐은 ‘나’를 다른 위치, 다른 가능성의 자리에 서게 한다(「애연」). 그런 점에서 “아무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서 주체는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주체임이 분명하다. 그 가능성을 실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존재의 취약함을 버텨 내는 일일 것이다. 전호석 시인이 형상화한 주체의 왜소함이 그러한 버팀을 가능성으로 전유하기 위해 한껏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곤경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버텨 내어 그 응축된 힘으로 몸을 움직여 “공간과 풍경을 자”르며(「모바일」) 나아가려는 도약에의 의지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윤리인지도 모르겠다.” (이상 이병국 문학평론가의 해설 중에서)
전호석 시인은 1989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2019년 [현대시]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시집 [스콜]을 썼다.
“전호석 시인이 표상하는 주체는 “불붙은 도화선처럼 해롱거렸고 끄트머리에 무엇이 달려 있을지도” 모르는 채 “부글부글” 끓고 있다(「수류탄」). 언제 터질지 모를 내면의 “균열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어”지더라도(「앞선 일행」) 그것이 환멸을 예비하는 데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전호석 시인은 끓는점에 도달한 주체에게 “참을 수 없어지면” “침묵 비슷한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선성(善性)」). 천성이 선한 시인은 세계를 향해 수류탄을 던지기보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택한다. “정면으로 마주치지 말 것/터진 마음을 추스를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아무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돌보고자 한다(「방울」). 이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한 것처럼 생명 없는 백색 표면들, 빛나는 검은 구멍들, 공허와 권태를 지닌 거대한 판으로서의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실패를 무릅쓰고 세계가 요구하는 것에 저항하는, 잉여적 존재의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라 말해도 좋을 것이다.
“아무 사람”은 그 무엇도 아닌 사람이자 잉여적 존재이지만, 세계의 균열을 체현하며 틈새를 확장하는 부정태로서의 주체를 긍정하는 기제이다. 전호석 시인의 “아무 사람”이 왜소화된 주체의 비애나 환멸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흐르는 것들은 흐르고 내리는 것들은 내”린다. 그것은 현상일 따름이다. 현상을 응시하는 본질로서의 “나는 있다”. ‘나’는 침범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다. “몸에 가득한 실금”이 “나를 괴롭히는 일”은 “이해의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불안을 야기할지언정 주체를 붕괴시키지는 못한다. 오히려 이러한 부정적 현상은 주체를 단단하게 하고 “온몸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다음 장면을 위”한 토대가 된다. 그럼으로써 전호석 시인의 ‘나’는 무엇에든 고착되지 않는 “아무 사람”이 되어 매 순간 유동하는 주체로 무한히 확장할 가능성을 획득하는 것이다.(「lecture」)
또한 확장 가능성은 주체의 내면에 한정되기보다는 타자를 향한 구체적 행위를 타진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모바일」) “다음 장면”을 생성하는 수행이야말로 전호석 시인이 희구하는 주체의 양태일 것이다. 비록 갈 곳 없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며 길 가장자리에서 얼룩 같은 구멍으로 존재하는 외롭고 쓸쓸한 ‘나’이더라도 “나는 당신을 책임지기로/당신은 나에게 책임져지기로 하”는 관계 맺음의 다짐은 ‘나’를 다른 위치, 다른 가능성의 자리에 서게 한다(「애연」). 그런 점에서 “아무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서 주체는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주체임이 분명하다. 그 가능성을 실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존재의 취약함을 버텨 내는 일일 것이다. 전호석 시인이 형상화한 주체의 왜소함이 그러한 버팀을 가능성으로 전유하기 위해 한껏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곤경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버텨 내어 그 응축된 힘으로 몸을 움직여 “공간과 풍경을 자”르며(「모바일」) 나아가려는 도약에의 의지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윤리인지도 모르겠다.” (이상 이병국 문학평론가의 해설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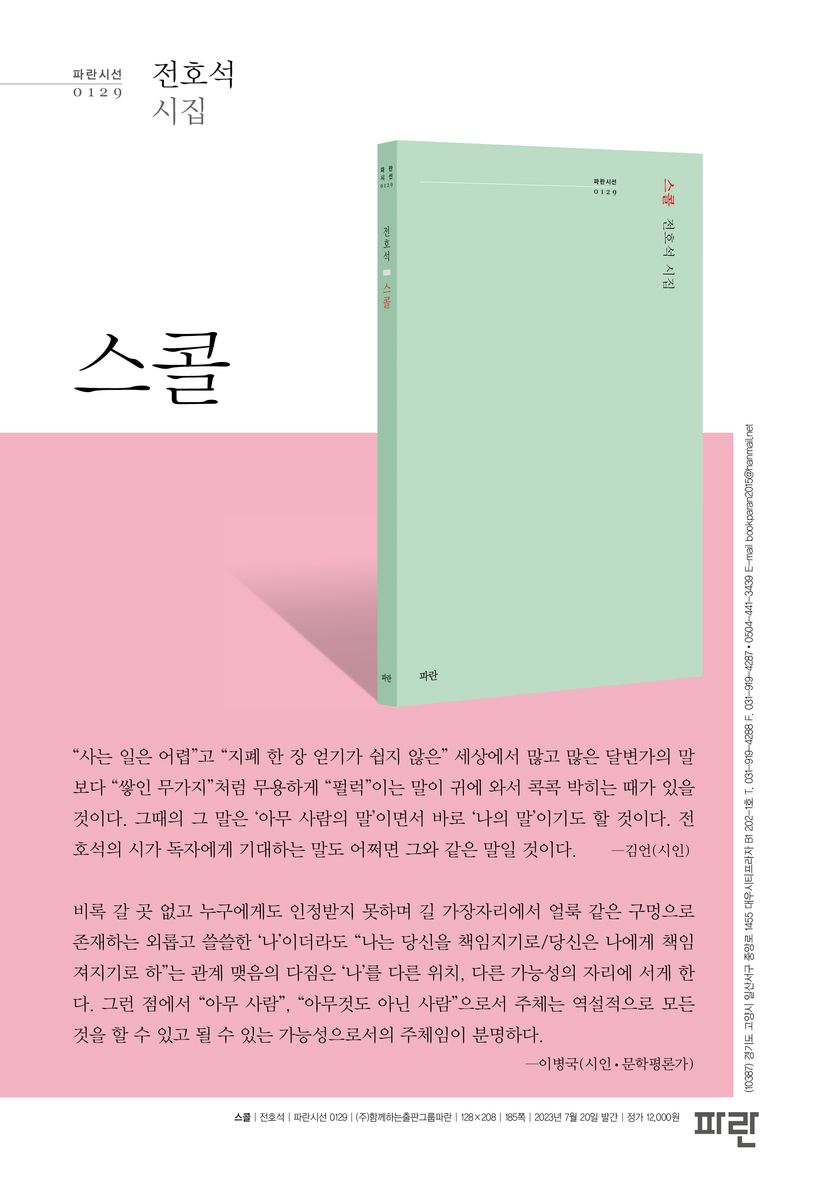

스콜 (전호석 시집)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