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scri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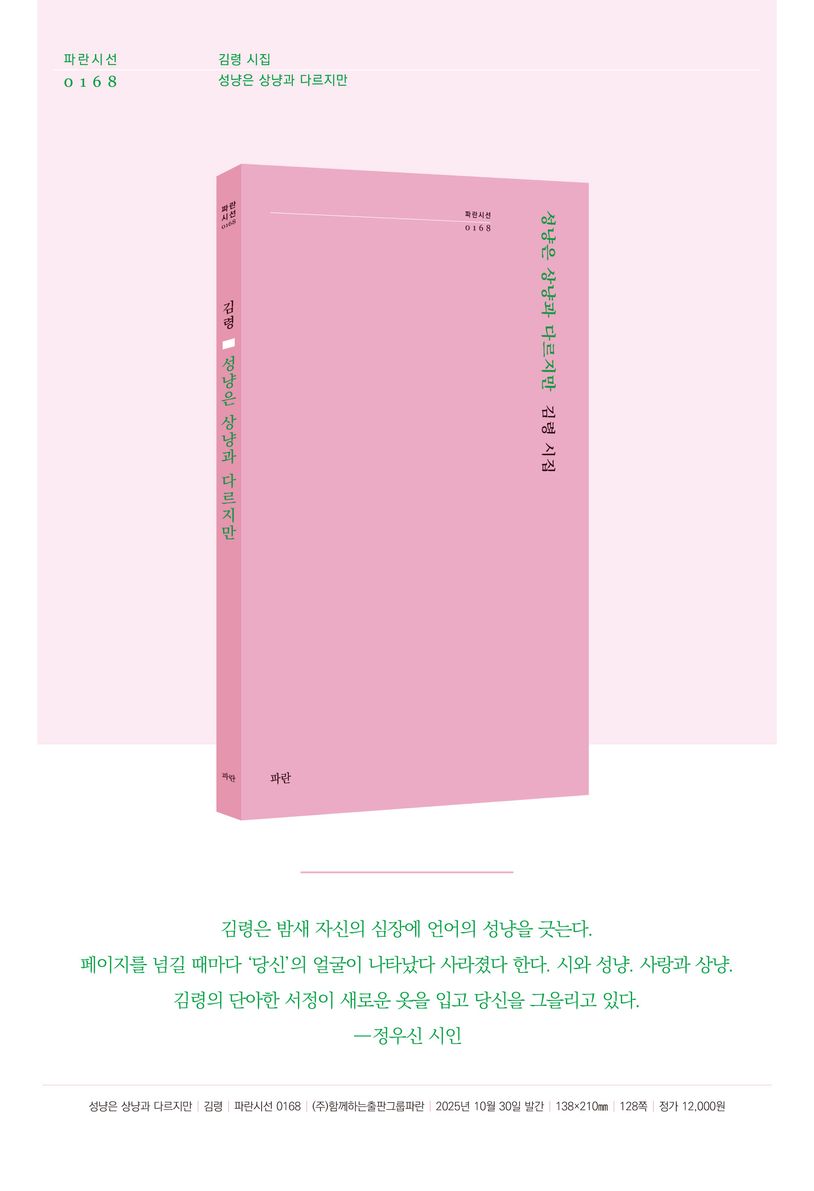
우는 것들의 힘으로 공중이 자란다
[성냥은 상냥과 다르지만]은 김령 시인의 두 번째 신작 시집으로, 「숲속에 누군가 있었네」 「산다」 「거기」 등 55편이 실려 있다.
김령 시인은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났으며, 2017년 [시와 경계]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시집 [어떤 돌은 밤에 웃는다] [성냥은 상냥과 다르지만]을 썼다.
김령 시인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현실적 삶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존재 자체를 부인당하는 고통의 모습들이다. 어쩌면 우리는 끝내 그 고통의 원인을 알아낼 수도, 그래서 해결한다고 약속할 수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기에 더욱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은 채 꽉 껴안은 모습 그대로의 고통 말이다. 그것은 시 「공중은 누구의 것인가」에서처럼 “영업 중, 임대합니다라는 팻말을/동시에 내건 가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구치감”에 갇힌 채로도 “여기가 내 집이라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결혼 이주 여성의 모습과도 꼭 닮아 있다(「주황과 노랑 어디쯤」).
그저 평범한 일상을 지낸다는 것은 어쩌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도 때로는 벅찬 일이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에 대해 무감각한 것 또한 사실이다. ‘나’ 역시 “숨어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일상이 “행복한 건지 불행한 건지” 도통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저 “숨”과 “울음”의 구별 없이 “토해 내”듯 내뱉어진 시간을 견디는 일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공중은 누구의 것인가」)
생각해 보면 문득 낯설어지는 우리의 삶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김령 시인이 이처럼 일상의 시간들에 가려진 죽음과 고통에 주목하는 것은 희망이라는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는 「헤이」에서처럼 “녹으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서리들”에 대해서 “사랑하게 될까”를 언제나 고민하고 있을 뿐이다. 시집 [성냥은 상냥과 다르지만]을 읽는 일은 그렇게 평온해 보이는 우리 삶의 수면을 뚫고 위로 솟아오른 것들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로도 무너질 수 있는” 것들(「모년 모월 모시」), 또는 “시간도 공간도 아닌” 것들에 대한(「거기」) 김령의 관심을 따라가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만일 그렇다면 우리 역시 “모서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될까. (이상 남승원 문학평론가의 해설 중에서)
김령 시인은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났으며, 2017년 [시와 경계]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시집 [어떤 돌은 밤에 웃는다] [성냥은 상냥과 다르지만]을 썼다.
김령 시인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현실적 삶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존재 자체를 부인당하는 고통의 모습들이다. 어쩌면 우리는 끝내 그 고통의 원인을 알아낼 수도, 그래서 해결한다고 약속할 수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기에 더욱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은 채 꽉 껴안은 모습 그대로의 고통 말이다. 그것은 시 「공중은 누구의 것인가」에서처럼 “영업 중, 임대합니다라는 팻말을/동시에 내건 가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구치감”에 갇힌 채로도 “여기가 내 집이라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결혼 이주 여성의 모습과도 꼭 닮아 있다(「주황과 노랑 어디쯤」).
그저 평범한 일상을 지낸다는 것은 어쩌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도 때로는 벅찬 일이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에 대해 무감각한 것 또한 사실이다. ‘나’ 역시 “숨어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일상이 “행복한 건지 불행한 건지” 도통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저 “숨”과 “울음”의 구별 없이 “토해 내”듯 내뱉어진 시간을 견디는 일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공중은 누구의 것인가」)
생각해 보면 문득 낯설어지는 우리의 삶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김령 시인이 이처럼 일상의 시간들에 가려진 죽음과 고통에 주목하는 것은 희망이라는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는 「헤이」에서처럼 “녹으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서리들”에 대해서 “사랑하게 될까”를 언제나 고민하고 있을 뿐이다. 시집 [성냥은 상냥과 다르지만]을 읽는 일은 그렇게 평온해 보이는 우리 삶의 수면을 뚫고 위로 솟아오른 것들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로도 무너질 수 있는” 것들(「모년 모월 모시」), 또는 “시간도 공간도 아닌” 것들에 대한(「거기」) 김령의 관심을 따라가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만일 그렇다면 우리 역시 “모서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될까. (이상 남승원 문학평론가의 해설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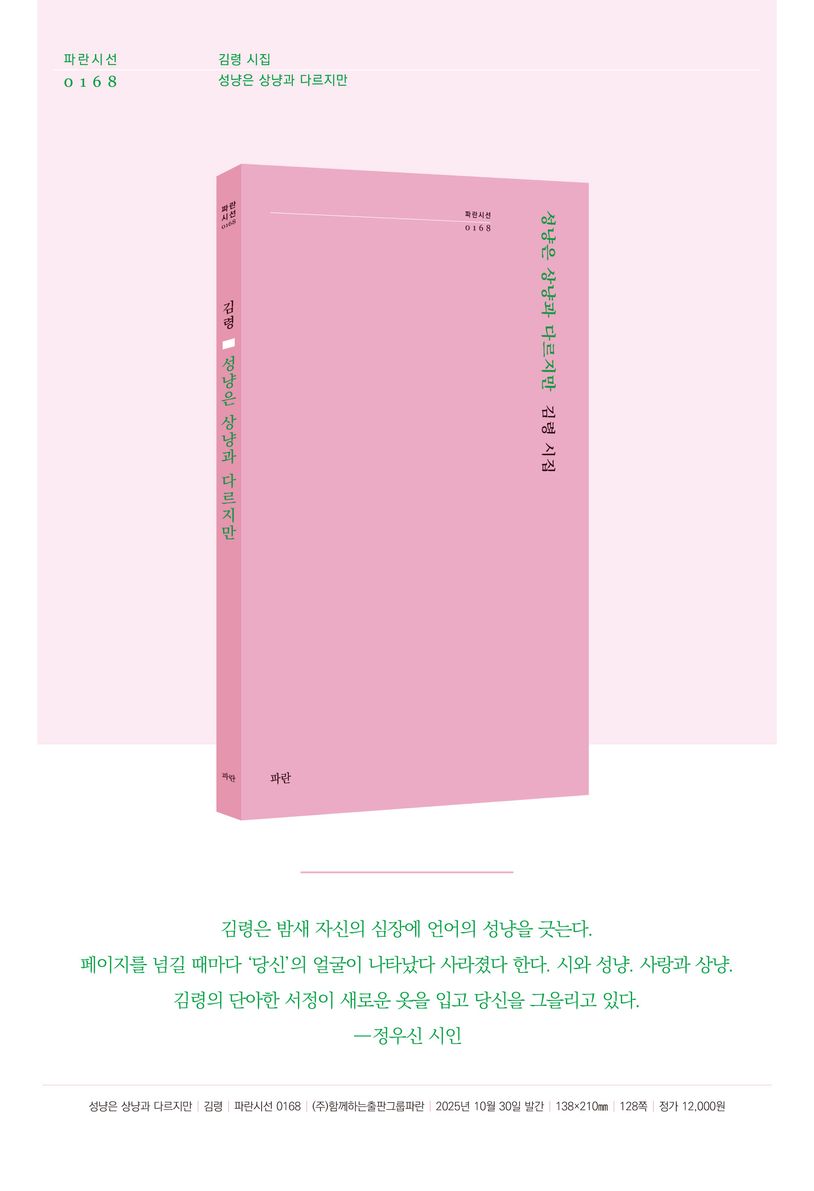

성냥은 상냥과 다르지만
$12.00